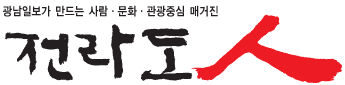| 장구 짊어진 60년 세월 "농악으로 하나 되는 대동세상 꿈꿔" [남도명인] 무형문화재 제17호 우도농악 보유자 김동언 전라도인 admin@jldin.co.kr |
| 2019년 07월 14일(일) 18:28 |
|
|
김동언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17호 우도농악 보유자) 명인은 그의 탯자리이자 예술적으로 든든하게 뿌리를 둔, 담양 와우리에 여전히 적을 두고 있다. 오늘날의 김 명인을 있게 한 것은 늘 풍물소리, 노랫가락이 그치지 않았던 마을 공동체의 힘에서 찾는다. 그가 이곳을 떠나지 않고 지켜온 이유다.
지난 5월9일 와우리 마을 어귀에 자리한 ‘우도농악 전수관’에서 그를 만났다. 자연스럽게 장구를 앞에 두고 앉은 김 명인은 간간이 장단을 치면서 60여년 장구 인생을 풀어 놓았다.
김 명인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제법 장구 잘 치는 꼬마로 통했다. 궁핍한 살림 탓에 장구를 가질 수 없던 그는 여러 날 궁리 끝에 쳇바퀴를 장구통으로 만들고 대나무에다 광목천을 덧 대 자신만의 장구를 만들어 쳤다. 가난했지만 장구에 대한 애정은 유년시절 그의 가슴을 두드렸다. 본격적으로 장구를 배운 것은 열여섯 살 무렵이다.
"청소년단체 ‘4H’에서 활동할 때죠. 농촌진흥원에서 전통예술 경연대회가 열렸는데, 와우리에서는 농악을 준비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이봉래 선생님에게 풍물가락을 제대로 배우게 됐죠. 그때 우리 마을에서 특등을 차지했고, 부상으로 송아지 한 마리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돼 정월대보름이면 그를 찾으러 온 사람들로 북적였다. 소위 장구를 잘 친다고 이 마을 저 마을로 팔려 다니게 된 것이다. 잠자고, 밥 먹고, 농사일을 돕는 시간을 제외하곤 미친 듯 장구만 쳤던 시절이다.
"여느 때처럼 농사일을 하고 있는데, 기가 막힌 가락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전에 듣던 것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지금도 생생하게 들려올 만큼 굉장했죠. 흥이 나선 지게를 벗어던지고 가락 소리를 찾아 달려 나갔죠. 거기서 제 인생을 바꿔 놓은 호남 제일의 상쇠 이주완, 설장고잡이 최막동 선생을 만나게 됩니다."
선생들의 화려한 무대를 보고 있던 그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그들에게 가 물었다. "어르신, 저 장구 한 번 쳐보면 안 될까요?" 그러자 선뜻 채를 내어줬는데, 김 명인이 가락을 선보이자 선생들은 주소를 적어주면서 자신들을 찾아오라고 일렀다. 그렇게 연을 맺어 그는 선생들과 함께 ‘호남창극단’ 일원이 돼 남도 곳곳을 돌아다녔다.
그는 스스로를 스승복, 인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한다.
|
열 아홉 살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혼인한 그는 가장으로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부담감으로 풍물판에서 잠시 멀어져야만 했다. 그러던 그를 다시 불러내 온 사람은 김회열 선생이었다. 김 선생의 권유로 그는 광산농악 단원이 돼 10여 년간 활동했다. 설장구 명인 김오채 선생을 만난 것도 이 때다.
"풍물 판에 설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김오채 선생이 어느 날 그래요. ‘전남 담양 사람이 왜 광산농악을 치느냐’고요. 전남으로 내려와서 자신의 제자가 돼달라는 말씀이셨죠. 아내와 상의한 끝에 전남에 남기로 했어요."
김오채 선생 아래로 들어간 지 반년. 본격적으로 선생의 장단을 배우기도 전, 건강이 안 좋으셨던 선생은 덜컥 세상을 떠나고 만다. 스승의 빈자리는 큰데, 1993년 김 명인은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17호 우도농악 후보자’로 지정을 받게 된다.
선물처럼 혹은 운명처럼 날아든 소식에 그는 대성통곡을 해야 했다. 그러면서 마음을 다잡은 게 있었다. 김오채 선생의 명성에 흠이 되지 않기 위해 더 좋은 장구잽이가 되자는 것이었다. 선생이 떠나고 없으니, 그가 남긴 비디오 테이프를 수십, 수 백 번을 돌려보면서 가락을 배워나갔다. 피나는 노력 끝에 후보자로 지정 받은 지 3년여 만에 그는 우도농악기능보유자로 이름을 올렸다. 예인으로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명예를 얻은 것이다.
"스승 복이 많았던 만큼, 여전히 그들을 가슴에 아로 새기며 살고 있어요. 매 해마다 남도농악명인 추모제를 이곳에서 열죠. 제 스승들은 물론 남도의 농악을 이끌었던 명인들을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벌써 올해로 16회째를 맞았어요. 이번 해에는 6월1일 추모제를 비롯해 담양우도농악 창립 10주년행사, 그리고 우리 제자들이 저를 위해 준비해 준 팔순까지. 농악 소리 울려 퍼지는 전통문화 잔치로 준비 중입니다."
그가 평생을 지켜온 우도농악은 호남 평야지대에서 발달한 농악이다. 섬진강 줄기를 따라 좌도는 영남산간지역, 우도는 호남 평야지역으로 나뉘는데, 좌도가 빠르고 남성적이라면, 오두는 여성적이면서도 섬세한 것이 특징이다.
그 중 담양은 이 좌도와 우도 농악의 특징이 각각 섞여 있는 곳이라 더 특별하다. 특히 다채로운 가락으로 혼을 빼놓는 애교 있는 설장구 놀음과 화려한 꽹과리 부포놀음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낼 수밖에 없다.
우도농악의 ‘꽃’과 같은 김동언류 설장구 가락은, 여러 스승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흔적들이 고스란히 묻어있다.
스승들의 가락의 특징들이 하나로 접목된 것이라 보면 된다. 화려하면서도 깊이가 있고, 풀어지는 듯 하면서 꽉 쪼이는 맛이 있어, 관객의 심금을 울리는 것이 김 명인만의 장구 가락이다.
"장구는 ‘음양’이 모두 들어있는 악기예요. 채편(오른쪽)은 아버지, 궁편(왼쪽)은 어머니예요. 궁편은 채편으로 넘어가 가락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채편은 궁편으로 절대 넘어가지 않죠. ‘집’을 지켜야 하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음양이 조화롭게 합을 맞춰야만 좋은 가락이 만들어 질 수 있습니다."
화려한 가락을 선보이는 그의 등은 조금 굽어있다. 어렸을 때부터 제 키만 한 지게를 짊어졌고, 또 장구를 메 온 세월의 무게 탓이다. 굽은 등으로 신명나는 장단을 두드리면서 김 명인은 "농악놀이와 같은 세상"에 대한 꿈을 이야기 한다.
"농악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장구, 꽹과리, 징, 북, 소고, 잡색 등 여러 사람이 함께 하는 집단 놀이에요. 절대 혼자 할 수 없죠. 특히 우도농악에서의 마당밟이굿은 집집마다 돌며 가정의 축복을 빌어주는 행위입니다. ‘나’가 아니라 ‘우리’ 즉 공동체가 우선이 되는 것이죠. 요즘 사회는 조금 척박합니다. 윤리의식의 균형이 틀어지고 있다는 반증으로 보여요. 나만 아는 세상이 아니라, 남도 배려할 줄 아는 세상. 서로 안아주고, 챙겨주고, 사랑하는 농악놀이와 같은 세상이 오길 바라요. 지금처럼 늘 겸손한 마음으로, 더 좋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에 신명나는 가락을 더하고 싶습니다."

 2025.12.08 (월) 00:22
2025.12.08 (월) 0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