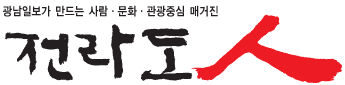| "마음 움직이는 연주를 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죠" [아트대담] 피아니스트 박재연 조선대 교수 전라도인 admin@jldin.co.kr |
| 2019년 09월 05일(목) 19:05 |
|
|
피아니스트 박재연(조선대 음악교육과 교수)씨가 피아노를 처음 본 것은 다섯 살 때다. 앞집에 마침 피아노를 가르치던 선생님이 이사를 오게 됐는데 열린 문 사이로 피아노란 악기가 어렴풋 보였다. 지금에야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당시만 해도 이웃끼리 곧잘 왕래하면서 살던 때라, 다섯 살 꼬마는 틈만 나면 앞집으로 건너갔다. 손가락으로 푹푹 찍어 누르면 아름다운 소리를 내던, 피아노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이다.
"한 음, 두 음 재미로 피아노를 만지기 시작했죠. 피아노에 꽤 흥미를 보이자, 어느 날은 선생님이 저를 앉혀두고 음계를 가르쳐 주셨어요. 레슨이라기보다는 선생님과 다섯 살 아이가 함께 노는 방식이었죠. 그렇게 이웃의 이사와 함께 제 인생에 피아노가 ‘훅’ 하고 들어왔고, 40여년 소중한 연을 맺어왔네요. 부모님이 처음 사주신 예쁜 갈색 콘솔 피아노, 전공을 결정한 후 그랜드 피아노가 제 방에 들어오던 순간의 흥분같은 것이 오랜만에 떠오르네요."
박 교수는 평범한 듯 평범하지만은 않은 아이였다. 튀는 걸 싫어했지만 또 묻히는 것도 좋아하지 않았던, 당찬 학생이었다. 숙제를 하지 않으면 찜찜한 마음에 놀 수 없었던, 제 할 일은 똑 부러지게 하는 아이였고, 마음이 여리고 따뜻해서 약한 것들에게 쉽게 마음을 내어주는 아이였다.
"정적인 듯하면서도, 충동적으로 큰 결정을 내리는 애였어요. 제가 좋아하는 일에 있어서는 뚝심 있게 밀고 나갈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 아이였던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피아노의 길로 들어섰고, 자연스럽게 예술중학교로 진학했습니다. 노란 스쿨버스와 체크스커트 교복이 예뻤던 선화예술중학교에 입학했고 이어 선화예고에서 수학했죠. 중고등학교 6년간 같은 학교 문으로 열심히도 다녔어요. 지금 생각하면 고작 6년이지만, 평생 남을 친구와 평생 배우고 싶은 선생님을 만나게 해준, 구석구석 소중했던 시간이었어요. 1교시 시작하기 전 새벽에 연습하려고, 아직 주무시고 있는 수위아저씨를 깨워 학교 정문을 제일 먼저 열고 들어가던 고3 시절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늘 1등으로 등교하던 그는 선화예고 재학시절 수석 장학금을 놓치지 않았다. 피아노에 푹 빠져 살았던 탓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어 서울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텍사스 주립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일본·중국·미국 등 해외 연주회는 물론 광주와 서울을 중심으로 한 국내 연주회로 그의 오랜 팬들을 만나고 있다.
그는 특히 뚜렷한 주제가 있는 연주회를 선호한다. 연주 콘셉트가 확실할수록 그만의 풍부한 표현력을 확실히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의 주요 연주들을 돌아보면 작년 라흐마니노프 서거 75주년 기념 피아노 듀오 두곡을 한 무대에 올렸습니다. 최근 서울과 광주에서 ‘Mozart Evening’이라는 부제로 전 프로그램이 Mozart 기반인 독주회를 가졌고요, 쇼팽 서거 170주년 기념으로 듀오 콘서트 ‘A Tribute to Chopin’에서 쇼팽의 피아노와 첼로를 위한 듀오 곡들을 연주했습니다. 저는 스토리가 분명한 음악들을 좋아해요. 연주에서도 뉘앙스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싶어 하는 스타일이죠. 절제보다는 분출 하고 싶어 하는 스타일이랄까요. 오래도록 가장 친숙하게 느껴온 작곡가는 모차르트인데요, 그가 남긴 음표들에 저만의 ‘표정’들을 담아내는 것이 연주의 가장 큰 즐거움이에요"
그의 연주 인생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연주회가 무엇이었느냐 물었다. 의외의 대답이 돌아온다. 크고 화려하고 또 중요한 연주 무대에 수도 없이 올랐을 텐데, 그가 꼽은 것은 20년 전 선보였던 석사 졸업 리사이틀이다.
"연주를 일주일 남기고 사고를 당해 응급실에 실려 가게 됐어요. 연주를 할 수는 있을까 걱정하며 겨우겨우 압박붕대를 풀고 무대에 올라갔는데, 그때 연주했던 쇼팽의 24개의 프렐류드가 무대에서 저에게 그렇게 응답해줄지 몰랐어요. 몸이 힘든 극한 상태여서 의지할 곳이 오히려 음악밖에 없었거든요. 저의 선생님께서 실기시험이나 연주전에 항상 습관처럼 하시던 말씀이 ‘Think of music only’였는데, 그저 단순히 관용구처럼 들리던 그 문장의 힘이 무슨 뜻인지 어렴풋이나마 알겠더라구요. 연주에 진심을 쏟는다는 게 어떤 힘이 있는지 조금이나마 깨닫게 됐죠."
그는 연주에 진심이 담기길 바란다. 듣는 이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예술의 본질이라 믿는다. 타인의 마음을 움직이길 바라는데 앞서 자신의 마음에 올곧게 담는 것이 우선이라는 게 그의 연주 철학이다.
"아무리 살아봐도 속일 수가 없는 게 음악이고 연주인 것 같아요. 한 자락도 가릴 수 없고, 쉬운 것이 없죠. 한음도 그냥 되는 것은 없어요. 지난 겨울 미국에서 연주를 끝내고 관객으로 왔던 한 분을 며칠 후 만났는데 끝에 이런 말을 해주시더군요. ‘네 연주를 듣는 동안 네 인생에 음악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내 진심을 알아주는 관객이 그걸 표현해 줄 때 연주자는 참 기쁘지요"
피아노와의 동행은 때론 벅찬 기쁨을 주지만, 버거운 순간도 많다. 피아노 없인 살 수 없으면서도, 매 순간 행복만을 선사하지는 않는다. 그게 참 오묘한 매력이다.
"독주자로서 홀로 무대를 감당해 낼 때, 앙상블 주자로서 다른 악기와 어우러져 온전한 한 가지를 만들어 낼 때, 그 희열이 모두 다릅니다. 나 혼자 무대를 꽉 채워야 할 때의 외로움과, 나 아닌 다른 연주자들과 최대한 한 몸이 돼 보려 거치는 시행착오들이 때로는 버겁기도 하지만, 그걸 채워내고 만들어냈을 때의 희열은 상당하답니다. 그건 단순한 성취감이 아닌 것 같아요. 아름다움에서 오는 기쁨이고 그 아름다움에 내가 어떤 ‘몫’을 했다는 것에 대한 감사에 가까워요."
박 교수는 하반기에도 분주히 움직인다. 제주도에서 ‘렉처콘서트’가 예정됐고 베토벤 탄생 250주년 기념의 해인 2020년을 앞두고 ‘베토벤 앙상블 시리즈’ 첫 공연을 시작할 계획이다. 연말에는 ‘삶과 죽음’을 주제로 한 피아노 듀오 연주회가 잡혀 있다.
그의 오랜 꿈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교단에 선 선생으로서 제자들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고 싶고, 피아니스트로서 좋은 연주자가 되고 싶다.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한 지점에 고여 있지 않고 유연한 인격체들로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 더 가치 있는 방향으로 자꾸 다가가길 바라고, 그 걸음걸음에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항상 생각해오는 음악인으로서의 목표는 ‘좋은 사람이 되어서 좋은 음악을 하는 것’이에요. 소박하게 들리지만 좋은 사람이 되는 것도, 좋은 음악을 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인생 끝까지 가지고 갈 꿈이자 바람입니다."

 2025.12.08 (월) 03:55
2025.12.08 (월) 03:55